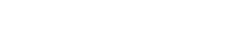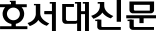문학이 기록하는 제주 4·3사건의 비극

“기억하지 않으면, 다시 반복된다.”
제주 4.3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침묵 속에 가려져 있던 비극이다. 한강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는 이 잊힌 역사 앞에 문학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섬세하게 보여준다.
제주 4.3사건은 1948년부터 1954년까지 미군정과 경찰의 무차별 진압으로 약 3만 명의 제주도민이 희생된 비극이다. 1947년 3.1절 집회에서 경찰의 발포로 시작된 갈등은 정부의 탄압과 남한 단독선거 반대, 무장봉기로 이어졌고, 이에 대한 강경 진압이 대규모 학살로 번졌다.
한강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는 이러한 제주 4.3사건의 아픔을 여실히 드러낸다. 책의 마지막 장을 덮고 나면, 단순한 소설을 뛰어넘어 그날의 진실과 마주하게 된다. 작가는 제주도민이 겪은 끔찍한 학살의 고통을 직면하게 하여 오늘날의 우리를 과거로 데려왔다. 주인공 ‘경하’, ‘인선’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학살 이후 ‘돌아오지 못하는 이들’을 기다리는 ‘남겨진 이들’의 치열한 삶을 마주하게 된다. 그 장면들은 고통스럽게 아름다웠다.
작중 인선은 손을 다쳐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손의 신경을 살리기 위해, 3분마다 바늘로 손가락을 찔러 고통을 느껴야 한다. 계속 피를 흘려야 한다. 인선은 자신의 손가락을 잃지 않기 위해 지속적인 고통을 느끼고 있다. 마치 4.3사건 피해자의 유가족이 떠나간 이를 잊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고통을 꺼내는 것처럼.
“처음엔 옷가지들이 바다에 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다 죽은 사람들이었어요.”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 옷가지 한 장 신발 한 짝도 없었어요. 총살했던 자리는 밤사이 썰물에 쓸려가서 핏자국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모래밭에서 죽였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바닷고기를 안 먹어요. 그 시국 때는 흉년에다가 젖먹이까지 딸려 있으니까, 내가 안 먹어 젖이 안 나오면 새끼가 죽을 형편이니 할 수 없이 닥치는 대로 먹었지요. 하지만 살 만해진 다음부터는 이날까지 한 점도 안 먹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갯것들이 다 뜯어먹었을 거 아닙니까?”
이처럼 역사적 비극을 문학으로 그려내는 일은 단순히 문학적 의의를 넘어 우리가 기억하는 방식이다. 역사 소설은 피해자의 삶을 같이 걸어가면서 독자를 역사적 그날로 데려가 공감하고 기억하게 한다.
‘작별하지 않는다’
무엇을 작별하지 않는 걸까. 왜 작별하지 못하는 걸까. 조심스레 추측하면, 떠나간 이에 대한 완전한 작별은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희생자의 유가족은 여전히 작별하는 중이다. 작별하지 않았기에 우리는 끝내 잊을 수 없고, 잊어서는 안 된다.